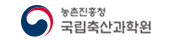[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 조사·발표 주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으로 일원화한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서 기존 고시 체계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격 발표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자시각 11면>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농가와 유통인 간 거래의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계란가격 조사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산란계협회(고시가격·희망가격)와 축평원(산지가격·거래가격)으로 이원화됐던 산지 가격 발표 체계를 축평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사후정산(후장기) 관행을 막기로 했다.
쟁점은 가격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 산란계협회 고시 가격은 ‘희망 가격’으로, 농가와 유통인이 이를 기준점 삼아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며 거래했다.
반면 축평원 가격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내역을 집계한 ‘과거 데이터’다. 농가와 유통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지난주 거래 가격 평균을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하는 방식이다.
생산자 업계는 “오늘 당장 거래할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주 평균 가격만 제시하는 것”이라며 “선행 지표인 희망 가격이 사라지면 가격 협상의 기준이 없어져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공정위 조사 이후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가 중단되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후 대안으로 출범한 계란가격조정협의회가 약 두 달간 운영했으나, 11월 공정위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가격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담합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현재까지 특란 등 큰 알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임에도, 산지 가격은 수도권 특란 기준 166원선에서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가와 유통인 모두 기준가격을 누가 먼저 제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축평원의 자발적 가격 입력 시스템은 참여율이 저조하고, 가격 변동도 없이 똑같은 수치만 나오는데 그걸 기준으로 협상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