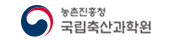[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오늘(1일)부터 산란계 사육기준이 강화됐다. 기존보다 닭 한 마리가 차지해야 하는 공간이 1.5배 넓어지면서, 농가들은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농가 적용은 2년 유예됐지만, 오늘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는 강화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원 없는 규제는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겠다며 계사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케이지 적재단수는 9단에서 12단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부처 간 공식 협의조차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 발표를 믿고 설비를 준비했던 농가만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건폐율 상향이나 케이지 단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한 방안이지만, 축사 증축과 구조 변경이 가축분뇨법 및 환경영향평가와 연동되면서,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에 따라 현실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대책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해 농가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식품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규제 완화 대책’이 반복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사육기준 강화와 함께 제시했던 농가 지원책들도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농가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선 규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최소한 2018년 대책 발표 이후 신축한 농장에 대한 소급 적용만큼은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재정적 지원 없이 규제만 앞세우면 계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 간 이견 지적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처: 축산경제신문